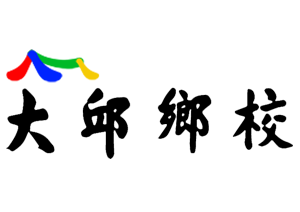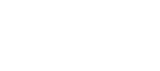孔子의 仁의 정의
안연이 仁을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기의 사욕을 이겨 예로 돌아감이 仁하는 것이니, 하루 동안이라도 사욕을 이겨 예에 돌아가면 천하가 인을 하는 것이다. 인을 하는 것은 자기 몸에 달려있으니, 남에게 달려있는 것이겠는가?
( 顔淵問仁한대 子曰 克己復禮爲仁이니 一日克己復禮면 天下歸仁焉하리니 爲仁由己니 而由人乎哉아)
안연이 “그 조목을 묻겠습니다.”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며,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 동하지 마는 것이다.” 안연이 말하였다. “제가 비록 불민하오나 청컨대 이 말씀을 종사하겠습니다. (顔淵曰 請問其目하노이다 子曰 非禮勿視하며 非禮勿聽하며 非禮勿言하며 非禮勿動이니라 顔淵曰 回數不眠이나 請事斯語矣리이다)
중궁이 인을 묻자, 공자께서 말씀 하셨다. “문을 나갔을 때에는 큰 손님을 뵈온 듯이 하며, 백성에게 일을 시킬 때에는 큰 제사를 받들 듯이 하고, 자신이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하니, 이렇게 하면 나라에 있어서도 원망이 없으며, 집안에 있어서도 원망함이 없을 것이다.” 중궁이 말하였다. 저 비록 불민하오나 청컨대 이 말씀을 종사하겠습니다. (仲弓問仁한대 子曰出門如見大賓하고 使民如乘大祭하며 己所不欲을 勿施於人이니 在邦無怨하며 在家無怨이니라 仲弓曰 雍雖不敏이나 請事斯語矣리이다)
사마우가 인을 물으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仁者는 그 말함이 참아서 하는 것이다.” 사마우가 말했다. “그 말하는 것을 참아서 하면 이 인을 이룰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을 행하기 어려우니, 말함에 참아서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司馬牛問仁한대 子曰 仁者는 其言也訒이니라 曰 其言也訒인이면 斯謂之仁矣乎잇가 子曰 爲之難하니 言之得無訒乎아. 犁는 보습 리이니 상퇴向魋의 동생이다.) 論語 顔淵 章에서
⁍중국(中國) 춘추시대(春秋時代) 노(魯)나라의 현인(賢人). 자(字)는 연(淵). 이름은 회(回). 안회(顔回)라고 흔히 부름. 지극히 가난하여 요절하자 공자께서 슬퍼하셨다.
⁍중궁(仲弓 : 염옹)은 공자가 안연(顔淵)·민자건(閔子騫)·염백우(冉伯牛)와 함께 덕행(德行)이 가장 뛰어난 제자라고 꼽은 사람이다. 그러나 중궁(仲弓)은 공자에게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평가를 받은 제자였다.
仁을 정의함에 克己復禮爲仁를, 己所不欲을 勿施於人, 仁者는 其言也訒( 訒:말 참을 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제자에 따라서 그 제자에게 알맞게 인식시켜 주셨으니, 공자님은 위대한 스승으로 세계 4대 성인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안연이 仁을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기의 사욕을 이겨 예로 돌아감이 仁하는 것이니, 하루 동안이라도 사욕을 이겨 예에 돌아가면 천하가 인을 하는 것이다. 인을 하는 것은 자기 몸에 달려있으니, 남에게 달려있는 것이겠는가?
( 顔淵問仁한대 子曰 克己復禮爲仁이니 一日克己復禮면 天下歸仁焉하리니 爲仁由己니 而由人乎哉아)
안연이 “그 조목을 묻겠습니다.”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며,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 동하지 마는 것이다.” 안연이 말하였다. “제가 비록 불민하오나 청컨대 이 말씀을 종사하겠습니다. (顔淵曰 請問其目하노이다 子曰 非禮勿視하며 非禮勿聽하며 非禮勿言하며 非禮勿動이니라 顔淵曰 回數不眠이나 請事斯語矣리이다)
중궁이 인을 묻자, 공자께서 말씀 하셨다. “문을 나갔을 때에는 큰 손님을 뵈온 듯이 하며, 백성에게 일을 시킬 때에는 큰 제사를 받들 듯이 하고, 자신이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하니, 이렇게 하면 나라에 있어서도 원망이 없으며, 집안에 있어서도 원망함이 없을 것이다.” 중궁이 말하였다. 저 비록 불민하오나 청컨대 이 말씀을 종사하겠습니다. (仲弓問仁한대 子曰出門如見大賓하고 使民如乘大祭하며 己所不欲을 勿施於人이니 在邦無怨하며 在家無怨이니라 仲弓曰 雍雖不敏이나 請事斯語矣리이다)
사마우가 인을 물으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仁者는 그 말함이 참아서 하는 것이다.” 사마우가 말했다. “그 말하는 것을 참아서 하면 이 인을 이룰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을 행하기 어려우니, 말함에 참아서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司馬牛問仁한대 子曰 仁者는 其言也訒이니라 曰 其言也訒인이면 斯謂之仁矣乎잇가 子曰 爲之難하니 言之得無訒乎아. 犁는 보습 리이니 상퇴向魋의 동생이다.) 論語 顔淵 章에서
⁍중국(中國) 춘추시대(春秋時代) 노(魯)나라의 현인(賢人). 자(字)는 연(淵). 이름은 회(回). 안회(顔回)라고 흔히 부름. 지극히 가난하여 요절하자 공자께서 슬퍼하셨다.
⁍중궁(仲弓 : 염옹)은 공자가 안연(顔淵)·민자건(閔子騫)·염백우(冉伯牛)와 함께 덕행(德行)이 가장 뛰어난 제자라고 꼽은 사람이다. 그러나 중궁(仲弓)은 공자에게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평가를 받은 제자였다.
仁을 정의함에 克己復禮爲仁를, 己所不欲을 勿施於人, 仁者는 其言也訒( 訒:말 참을 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제자에 따라서 그 제자에게 알맞게 인식시켜 주셨으니, 공자님은 위대한 스승으로 세계 4대 성인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