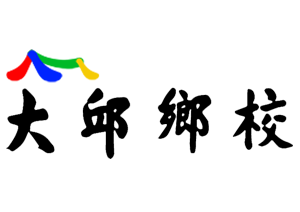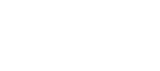▲弟子蓋三千焉: 사기에 이르기를 ’제자가 3천 명인데 몸소 육례를 통달한 자가 72명이었다.‘ (史記曰 弟子蓋三千焉 身通六藝者 七十二人. 爲學 近思錄集解)
▲二爲腓(비) 三爲股(고) 五爲脢(매): 咸卦는 사람의 몸을 象으로 취하였으니, 初는 엄지발가락이 되고, 二는 장단지가 되고, 三은 다리가 되고, 五는 등뼈가 되고, 上은 輔脥(뺨)과 혀가 된다. 四는 마음(심장)의 자리에 해당하는데, 마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감동함을 반드시 마음으로써 하기 때문이다. (咸卦 取象人身 初爲拇 二爲脢 三爲股 五爲脢 上爲輔頰舌 四當心位而不言心者 感者 必以心也. 爲學 近思錄集解)
▲曁(기)乎三王迭興: 삼왕(禹王, 湯王, 文王)이 번갈아 일어남에 三重(三王의 禮)이 이미 갖추어지니, 子月, 丑月, 寅月로 正月을 삼음과 忠·質·文을 번갈아 숭상함에 人道가 갖추어지고 天運이 一周하였다.⟪中庸⟫에 ”천하의 왕노릇함(천하를 다스림)에는 三重(三王之禮)이 있다고 했다.(曁乎三王迭興 三重旣備 子丑寅之建正 忠質文之更(경)尙 人道備矣 天運周矣. 卷三致知 近思錄集解)
▲能用三傑: 漢나라를 일으킨 세 英傑로 張良, 蕭何(소하), 韓信을 가리킨다.(觀高祖寬大長者 能用三傑. 卷三 致知 近思錄集解)
▲不一則二三矣: 하나로 하지 않으면 二三(이랬다 저랬다 함)이 된다. (卷四 存養 近思錄集解)
▲三 × 三德 = 書經에 皐陶(고요, 순임금의 신하)가 말하기를 “행실을 총괄하여 말할진댄 아홉가지 德있다. 九德이 最好라. 蔡沈先生의 註에 ①寬而栗 - 너그러우면서도 장중(莊栗)한 것, ②柔而立 - 유순하면서고 꼿꼿이 서는 것, ③愿而恭 - 삼가면서고 공손한 것 ④亂而敬 - 다스리는 재주가 있으면서도 경외하는 것 ⑤擾而毅 - 길들이고 익숙하면서도 과감한 것 ⑥直而溫 - 곧으면서도 온화한 것 ⑦簡而廉 - 簡易하면서도 모가 나는 것 ⑧剛而塞 - 강건하면서도 독실한 것 ⑨彊而義 - 용감하면서도 의를 좋아하는 것 (卷五 克己 近思錄集解)
▲九三爻: 井卦에 九三爻는 九三이 陽剛으로 下卦위에 처했으니, 우물이 깨끗이 다스려졌는데도 먹어주지 않으니 이는 바로 사람이 재주와 지혜가 있는데도 쓰여지지 못하여 행하지 못함을 근심하고 서글퍼 하는 것이다. (卷七 出處 近思錄集解)
▲三辭不聽: 先生이 元祐 초기에 大臣의 추천으로 校書郎에 제수되었는데, 세 번 사양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卷七 出處 近思錄集解)
▲先者有三: 伊川선생이 말했다. 當世의 일 중에 더더욱 먼저 해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으니, 一曰立志(뜻을 세우는 것), 二曰責任(임무를 맡기는 것), 三曰求賢(현자를 구하는 것)이다.
(卷八 治本 近思錄集解)
▲田之三驅: 사냥할 적에 삼면만 포위를 하고 앞에 한 길을 열어 주어 달려오는 것을 잡고 도망가는 것은 쫒지 않으니, 애당초 작은 은혜를 잡아서 사람들이 친해주기를 구하지 않는 것과 같다. (卷八 治本 近思錄集解)
▲三舍升補: 退溪曰 三舍는 外舍, 內舍, 上舍를 이르고 升補는 처음 외사에 들어갔다가 外舍에서 內舍로 올라가고 內舍에서 上舍로 오라감을 말한 것이다. 三舍를 升補하는 법은 모두 法條文을 상고하고 자취를책하나 有司의 일이요 庠序에서 人才를 기르고 俊秀한 자를 논하는 도리가 아니다. (卷九 治法 近思錄集解)
▲春秋三傳: 공자님이 지으신 春秋傳을 풀이하는 세 가지 전으로 春秋左傳, 春秋公羊傳, 春秋穀梁傳을 이르는 말. 그 외에도 春秋鄒氏傳左氏傳, 春秋劦氏傳이 있다고 한다.
▲不在三叛之數: 哀公14년 “小邾射以句繹來奔(소주사이句역래분)을 서수색린(西狩色麟”뒤에 기록하였다. 만약 획린 이후도 孔子께서 편수한 경이라면 소주석(小邾射)을 당연히 주서기·소공(昭公 31년)·거모이(소공 5년 經) 등과 같이 취급하여 叛人을 넷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左傳》에 세 반인을 칭하면서(소공31년 經) 소주석을 3叛의 수를 넣지 않았으니, 이로 미루어 經을 ’孔丘卒‘까지 늘인 것은 매우 심한 거짓이다. (春秋左氏傳序)

▲三逐巴師: 《定意》에 삼축파사는 鄧師가 파사를 추격한 것이고, 不克은 楚와 巴의 군대가 鄧師를 이기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鬪廉이 꾀를 내어 등사를 유인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魯桓公 春秋左氏傳)
▲三無五起之說: 〈孔子閒居〉에 나오는 :子夏曰 言則大矣美矣盛矣 言盡於此而已乎 孔子曰 何爲其然也 君子之服之也 猶有五起焉...“까지를 가리킨다. (禮記輯說大全 總論)
▲莫如三策: 3책은 董仲舒의 天人三策을 말한다. 武帝는 즉위하자 賢良文學科선비를 전후로 백 여 명을 등용하였는데 동중서가 이 과목으로 응시하여 대책을 올렸는데 그 요지는 天人感應이었다. 모두 세 번을 올렸으므로 세상에서 천인삼책이라 불렀다. (禮記輯說大全 總論)
▲日用三牲之養: 三牲은 소(牛), 양(羊), 돼지(豕)를 말하며 날마다 삼생을 갖추어 봉양하다.(曲禮 上 第一 禮記輯說大全)
▲ 三賜: 三賜는 세 번째 내리는 命이니 즉 三命을 말한다. (三賜三命) 《禮記 注疏》 三命의 命은 爵名을 의미하며 三命은 곧 公이나 侯伯의 卿이다. (曲禮 上 第一 禮記輯說大全)
▲有三辭: 疏에 天子는 五門, 諸侯는 三門 大夫는 二門이다. 禮에 세 가지 사양이 있는데, 처음 사양하는 것을 禮辭, 두 번째 사양하는 것을 固辭, 세 번째 사양하는 것을 終辭라고 한다.(曲禮 上 第一 禮記輯說大全)
▲二爲腓(비) 三爲股(고) 五爲脢(매): 咸卦는 사람의 몸을 象으로 취하였으니, 初는 엄지발가락이 되고, 二는 장단지가 되고, 三은 다리가 되고, 五는 등뼈가 되고, 上은 輔脥(뺨)과 혀가 된다. 四는 마음(심장)의 자리에 해당하는데, 마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감동함을 반드시 마음으로써 하기 때문이다. (咸卦 取象人身 初爲拇 二爲脢 三爲股 五爲脢 上爲輔頰舌 四當心位而不言心者 感者 必以心也. 爲學 近思錄集解)
▲曁(기)乎三王迭興: 삼왕(禹王, 湯王, 文王)이 번갈아 일어남에 三重(三王의 禮)이 이미 갖추어지니, 子月, 丑月, 寅月로 正月을 삼음과 忠·質·文을 번갈아 숭상함에 人道가 갖추어지고 天運이 一周하였다.⟪中庸⟫에 ”천하의 왕노릇함(천하를 다스림)에는 三重(三王之禮)이 있다고 했다.(曁乎三王迭興 三重旣備 子丑寅之建正 忠質文之更(경)尙 人道備矣 天運周矣. 卷三致知 近思錄集解)
▲能用三傑: 漢나라를 일으킨 세 英傑로 張良, 蕭何(소하), 韓信을 가리킨다.(觀高祖寬大長者 能用三傑. 卷三 致知 近思錄集解)
▲不一則二三矣: 하나로 하지 않으면 二三(이랬다 저랬다 함)이 된다. (卷四 存養 近思錄集解)
▲三 × 三德 = 書經에 皐陶(고요, 순임금의 신하)가 말하기를 “행실을 총괄하여 말할진댄 아홉가지 德있다. 九德이 最好라. 蔡沈先生의 註에 ①寬而栗 - 너그러우면서도 장중(莊栗)한 것, ②柔而立 - 유순하면서고 꼿꼿이 서는 것, ③愿而恭 - 삼가면서고 공손한 것 ④亂而敬 - 다스리는 재주가 있으면서도 경외하는 것 ⑤擾而毅 - 길들이고 익숙하면서도 과감한 것 ⑥直而溫 - 곧으면서도 온화한 것 ⑦簡而廉 - 簡易하면서도 모가 나는 것 ⑧剛而塞 - 강건하면서도 독실한 것 ⑨彊而義 - 용감하면서도 의를 좋아하는 것 (卷五 克己 近思錄集解)
▲九三爻: 井卦에 九三爻는 九三이 陽剛으로 下卦위에 처했으니, 우물이 깨끗이 다스려졌는데도 먹어주지 않으니 이는 바로 사람이 재주와 지혜가 있는데도 쓰여지지 못하여 행하지 못함을 근심하고 서글퍼 하는 것이다. (卷七 出處 近思錄集解)
▲三辭不聽: 先生이 元祐 초기에 大臣의 추천으로 校書郎에 제수되었는데, 세 번 사양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卷七 出處 近思錄集解)
▲先者有三: 伊川선생이 말했다. 當世의 일 중에 더더욱 먼저 해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으니, 一曰立志(뜻을 세우는 것), 二曰責任(임무를 맡기는 것), 三曰求賢(현자를 구하는 것)이다.
(卷八 治本 近思錄集解)
▲田之三驅: 사냥할 적에 삼면만 포위를 하고 앞에 한 길을 열어 주어 달려오는 것을 잡고 도망가는 것은 쫒지 않으니, 애당초 작은 은혜를 잡아서 사람들이 친해주기를 구하지 않는 것과 같다. (卷八 治本 近思錄集解)
▲三舍升補: 退溪曰 三舍는 外舍, 內舍, 上舍를 이르고 升補는 처음 외사에 들어갔다가 外舍에서 內舍로 올라가고 內舍에서 上舍로 오라감을 말한 것이다. 三舍를 升補하는 법은 모두 法條文을 상고하고 자취를책하나 有司의 일이요 庠序에서 人才를 기르고 俊秀한 자를 논하는 도리가 아니다. (卷九 治法 近思錄集解)
▲春秋三傳: 공자님이 지으신 春秋傳을 풀이하는 세 가지 전으로 春秋左傳, 春秋公羊傳, 春秋穀梁傳을 이르는 말. 그 외에도 春秋鄒氏傳左氏傳, 春秋劦氏傳이 있다고 한다.
▲不在三叛之數: 哀公14년 “小邾射以句繹來奔(소주사이句역래분)을 서수색린(西狩色麟”뒤에 기록하였다. 만약 획린 이후도 孔子께서 편수한 경이라면 소주석(小邾射)을 당연히 주서기·소공(昭公 31년)·거모이(소공 5년 經) 등과 같이 취급하여 叛人을 넷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左傳》에 세 반인을 칭하면서(소공31년 經) 소주석을 3叛의 수를 넣지 않았으니, 이로 미루어 經을 ’孔丘卒‘까지 늘인 것은 매우 심한 거짓이다. (春秋左氏傳序)
▲三逐巴師: 《定意》에 삼축파사는 鄧師가 파사를 추격한 것이고, 不克은 楚와 巴의 군대가 鄧師를 이기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鬪廉이 꾀를 내어 등사를 유인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魯桓公 春秋左氏傳)
▲三無五起之說: 〈孔子閒居〉에 나오는 :子夏曰 言則大矣美矣盛矣 言盡於此而已乎 孔子曰 何爲其然也 君子之服之也 猶有五起焉...“까지를 가리킨다. (禮記輯說大全 總論)
▲莫如三策: 3책은 董仲舒의 天人三策을 말한다. 武帝는 즉위하자 賢良文學科선비를 전후로 백 여 명을 등용하였는데 동중서가 이 과목으로 응시하여 대책을 올렸는데 그 요지는 天人感應이었다. 모두 세 번을 올렸으므로 세상에서 천인삼책이라 불렀다. (禮記輯說大全 總論)
▲日用三牲之養: 三牲은 소(牛), 양(羊), 돼지(豕)를 말하며 날마다 삼생을 갖추어 봉양하다.(曲禮 上 第一 禮記輯說大全)
▲ 三賜: 三賜는 세 번째 내리는 命이니 즉 三命을 말한다. (三賜三命) 《禮記 注疏》 三命의 命은 爵名을 의미하며 三命은 곧 公이나 侯伯의 卿이다. (曲禮 上 第一 禮記輯說大全)
▲有三辭: 疏에 天子는 五門, 諸侯는 三門 大夫는 二門이다. 禮에 세 가지 사양이 있는데, 처음 사양하는 것을 禮辭, 두 번째 사양하는 것을 固辭, 세 번째 사양하는 것을 終辭라고 한다.(曲禮 上 第一 禮記輯說大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