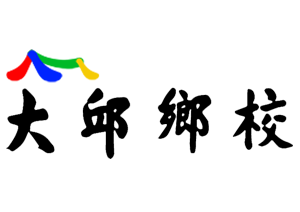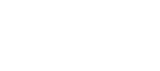▲三尺之劍: 春秋때 魯나라 장군 曺沫이 三尺劍으로 桓公 앞에서 빼앗았던 땅을 다시 반환할 것을 요구하자 환공은 그 위협에 눌려 승낙하고 말았다. (戰國策 제10권)
▲士三食不得饜(염): 선비들은 하루 세끼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데, 거위와 오리들은 오히려 먹이가 남아돌고 후궁들은 비단옷 입고 치맛자락을 끌고 다닌다. (’士三食不得饜 而君鵝鶩有餘食 下宮糅紈‘ 전국책 제11권) *鵝-거위 아 鶩-집오리 목 糅-섞을뉴(유) 紈-흰비단 환
▲三晉: 韓, 魏, 趙 세 나라 (夫三晉 大夫 皆不便秦 戰國策 제13권)
▲三國可定也: 진나라와 초나라가 이렇게 연합한 후면 나머지 연·조·위 삼국은 당연히 평정할 수 있게 되며, 그렇게 되면 연·조·위 세 나라는 감히 말을 듣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秦楚之合 而燕·趙·魏不敢不聽 三國可定也. 戰國策 제15권)
▲三子之計: 과인이 세 사람의 계책 중에 누구의 말을 들어야 옳겠습니까? 신자가 대답했다. 왕께서는 세 사람의 말을 모두 쓰십시오. (寡人誰用於 三子之計? 愼子對曰 王皆用之 戰國策 제15권)
▲水擊三千里: 붕이 남쪽 바다로 날아 옮겨갈 때에는 <그 큰 날개로> 바다의 수면을 3천 리나치고서 회오리바람을 타고서 9만 리 꼭대기까지 올라간다. (鵬之徒於南冥也 水擊三千里 搏扶搖 而上者九萬里 去以六月息者也 莊子 1편 逍遙遊)
▲三飡(손): 가까운 교외의 들판에 나가는 사람은 세 끼의 밥만 먹고 돌아와도 배가 아직 부르고 백리 길을 가는 사람은 전날 밤에 식량을 방아 찧어 준비해야 하고 천리 길을 가는 사람은 3개월 전부터 식량을 모아 준비해야 한다. (適莽蒼者 三飡而反 腹猶果然 適百里者 宿春糧 適千里者 三月聚糧. 莊子 1편 逍遙遊)
▲朝三暮四: 아침에 세 개를 주고 저녁에 네 개를 줌. 이 故事는 ≪列子≫에에 보인다. 흔히 간사하고 앝은 꾀로 속이는 행위를 지칭하지만 도리어 그런 꾀에 속는 어리석은 무리를 비유한 것이다. (莊子 2편 齊物論)
▲三子孰知正處: 세 가지 중에서 누가 올바른 거처를 아는가. 사람과 물고기, 원숭이는 각각 다른 주거지(서식처)를 지니고 있는데, 그 어느 것도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한 내용. (莊子 2편 齊物論)
▲夫三子者: 순이 대답했다. 이 세 나라는 아직도 쑥밭 사이에 있는데, 당신께서 석연치 않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舜曰 夫三子者 猶存乎蓬艾之間 若不釋然 何哉 莊子 2편 齊物論)
▲三號而出: 노담이 죽었는데 진일이 조문하러 가서 세 번 호곡하고 나와 버렸다. 노담의 제자가 조문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형식적인 조문하는 것을 뜻함. (老聃(담)死 秦失(일)弔之 三號而出 弟子曰 非夫子之友邪 莊子 3편 養生主)
▲狂酲(정)三日而不已: 사흘이 지나도 취기가 가시지 않음 酲:숙취 정 (莊子 4篇 人間世)
▲三人相與友: 子桑戶, 孟子反, 子芩張 세 사람이 사귀면서 말했다. 세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빙그레 웃으면서 각자의 마음에 거스르는 바가 없게 되어 마침내 서로 벗이 되었다. (莊子 6篇 大宗師)
▲無是三者: 孟孫才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哭泣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며, 마음속에 슬픔을 느끼지 아니하고, 상을 치르면서 서러워하지도 않았다. 이 세 가지가 없었는데도 喪禮를 치렀다는 명성이 魯나라를 덮었다. (莊子 6篇 大宗師)
▲可以參三才: 아! 사람이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어서 三才에 참여되어 만 가지 조화를 낼 수 있는 것은 본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才는 才質과 才能을 겸하여 말한 것으로, 곧 天·地·人을 가리킨다. (人之得名爲人 可以參三才 而出萬化者 以能不失其本心已. 心經附註序)
▲當合三先生: 敬을 잡아 지키는 방도는 마땅히 세 선생의 말씀을 합하여 공부해야 할 것이다. 三先生은 程子(伊川), 謝上蔡, 尹和靖 (持敬之道 當合三先生之言 而用力焉 然後內外交相養之功 始備. 敬以直內章 心經附註)
▲曾子三省: 나는 날마다 세 가지로 내 몸을 살피니 ’남을 위하여 일을 도모하면서 충성스럽지 않는가, 붕우와 사귀면서 信實하지 않는가, 스승에게 전수받은 것을 익히지 않았는가?‘ (吾日三省吾身 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 懲忿窒慾章 心經附註 )
▲三十而浸盛: 나는 타고난 기운이 매우 부족하여 30세가 되면서 점점 성해졌고, (四,五十세가 되어서야 완전해 졌다.(伊川先生曰 謂張思叔曰 三十而浸盛 四十五十以後完. 懲忿窒慾章 心經附註)
▲名三畏齋: 天命을 두려워하고 大人을 두려워하고 聖人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朱子曰 和靖尹公 一室 名三畏齋 取畏天命 畏大人 畏聖人之言之意. 禮樂不可斯須去身章 心經附註)
▲必三歎焉: 언제나 南軒張公의 ’위한 바가 없이 한다‘는 말씀을 욀 때에는 반드시 세 번 감탄하셨다.(每頌南軒張公 無所爲而然之語 必三歎焉. 尊德性齋銘 心經附註)
▲故有三才之別: 陰陽이 象을 이룸은 天道가 확립되는 것이요, 剛柔가 형질을 이룸은 地道가 확립되는 것이요, 仁義가 德을 이룸은 人道가 확립되는 것이니, 道가 하나(태극)일 뿐이나 일에 따라 나타나므로 三才가 구별이 있는 것이다. (陰陽成象 天道之所以立也 剛柔性質 地道之所以立也 仁義性德 人道之所以立也 道一而已 隋事著見 故有三才之別. 道體 近思錄集解)
▲積三十日而成一月: 한 기운이 갑자기 사라짐이 없고 또한 갑자기 자라남이 없으니, 卦를 달에 배합하면 30일을 쌓아 한 달을 이루고 또한 30분을 쌓아 한 爻를 이룬다. 9월은 괘에 있어서 박괘(剝卦)기 되니 陽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아니하여 아직 上九가 힌 효가 되어 卦로부터 剝卦에 이르기까지 30일이 되어야 陽이 비로소 다 사라지고 박괘(剝卦)로부터 坤卦에 이르기까지 30일이 되어야 비로소 坤卦에 이른다. (一氣武頓消 亦無頓息 以卦配月 積三十日而成一月 亦積三十分而成一爻. 道體 近思錄集解)
▲如三過其門不入: 세 번이나 자기 집 문 앞을 지나가면서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 禹·稷의 때에 있어서는 中이 되지만 만약 누추한 골목에서 거한다면 中이 아니며, 누추한 골목에 거하는 것이 顔子의 때에 있어서는 中이 되지만 만약 세 번이나 자기 집 앞을 지나가면서도 들어가지 않는다면 中이 아니다. (如三過其門不入 在禹稷之世 爲中 若居陋巷則非中也 居陋巷 在顔子之時 爲中 若三過其門不入則非中也. 道體 近思錄集解)
▲禮儀三百, 威儀三千: 예의 삼백 가지와 위의 삼천 가지가 한 가지 물건도 仁이 아닌 것이 없다. (禮儀三百 威儀三千 無一物而非仁也. 道體 近思錄集解),
▲三月不違仁: 伊尹과 顏淵은 大賢이니 그 군주가 堯·舜과 같은 성군이 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한 사람(家長)살 곳을 얻지 못하면 시장에서 종아리 맞는 것처럼 부끄럽게 여겼으며, 안연은 노여움을 남에게 옮기지 않고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았으며 3개월 동안 인을 떠나지 않았다.(伊尹顏淵 大賢也 伊尹 恥其君不爲堯舜 一夫不得其所 若達于市 顏淵 不遷怒 不貳過 三月不違仁. 爲學 近思錄集解)
▲其徒三千: 혹자가 성인(孔子)의 문하에 문도가 3천 명이었는데, 유독 顔子만을 배우기 좋아한다고 칭찬하셨다. 詩書六藝를 3천 명의 제자가 익혀서 통달하지 않음이 없었었다.(或問 聖人之門 其徒三千 獨稱顏子爲好學 夫詩書六禮 三千子非不習而通也. 爲學 近思錄集解)
▲士三食不得饜(염): 선비들은 하루 세끼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데, 거위와 오리들은 오히려 먹이가 남아돌고 후궁들은 비단옷 입고 치맛자락을 끌고 다닌다. (’士三食不得饜 而君鵝鶩有餘食 下宮糅紈‘ 전국책 제11권) *鵝-거위 아 鶩-집오리 목 糅-섞을뉴(유) 紈-흰비단 환
▲三晉: 韓, 魏, 趙 세 나라 (夫三晉 大夫 皆不便秦 戰國策 제13권)
▲三國可定也: 진나라와 초나라가 이렇게 연합한 후면 나머지 연·조·위 삼국은 당연히 평정할 수 있게 되며, 그렇게 되면 연·조·위 세 나라는 감히 말을 듣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秦楚之合 而燕·趙·魏不敢不聽 三國可定也. 戰國策 제15권)
▲三子之計: 과인이 세 사람의 계책 중에 누구의 말을 들어야 옳겠습니까? 신자가 대답했다. 왕께서는 세 사람의 말을 모두 쓰십시오. (寡人誰用於 三子之計? 愼子對曰 王皆用之 戰國策 제15권)
▲水擊三千里: 붕이 남쪽 바다로 날아 옮겨갈 때에는 <그 큰 날개로> 바다의 수면을 3천 리나치고서 회오리바람을 타고서 9만 리 꼭대기까지 올라간다. (鵬之徒於南冥也 水擊三千里 搏扶搖 而上者九萬里 去以六月息者也 莊子 1편 逍遙遊)
▲三飡(손): 가까운 교외의 들판에 나가는 사람은 세 끼의 밥만 먹고 돌아와도 배가 아직 부르고 백리 길을 가는 사람은 전날 밤에 식량을 방아 찧어 준비해야 하고 천리 길을 가는 사람은 3개월 전부터 식량을 모아 준비해야 한다. (適莽蒼者 三飡而反 腹猶果然 適百里者 宿春糧 適千里者 三月聚糧. 莊子 1편 逍遙遊)
▲朝三暮四: 아침에 세 개를 주고 저녁에 네 개를 줌. 이 故事는 ≪列子≫에에 보인다. 흔히 간사하고 앝은 꾀로 속이는 행위를 지칭하지만 도리어 그런 꾀에 속는 어리석은 무리를 비유한 것이다. (莊子 2편 齊物論)
▲三子孰知正處: 세 가지 중에서 누가 올바른 거처를 아는가. 사람과 물고기, 원숭이는 각각 다른 주거지(서식처)를 지니고 있는데, 그 어느 것도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한 내용. (莊子 2편 齊物論)
▲夫三子者: 순이 대답했다. 이 세 나라는 아직도 쑥밭 사이에 있는데, 당신께서 석연치 않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舜曰 夫三子者 猶存乎蓬艾之間 若不釋然 何哉 莊子 2편 齊物論)
▲三號而出: 노담이 죽었는데 진일이 조문하러 가서 세 번 호곡하고 나와 버렸다. 노담의 제자가 조문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형식적인 조문하는 것을 뜻함. (老聃(담)死 秦失(일)弔之 三號而出 弟子曰 非夫子之友邪 莊子 3편 養生主)
▲狂酲(정)三日而不已: 사흘이 지나도 취기가 가시지 않음 酲:숙취 정 (莊子 4篇 人間世)
▲三人相與友: 子桑戶, 孟子反, 子芩張 세 사람이 사귀면서 말했다. 세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빙그레 웃으면서 각자의 마음에 거스르는 바가 없게 되어 마침내 서로 벗이 되었다. (莊子 6篇 大宗師)
▲無是三者: 孟孫才는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哭泣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며, 마음속에 슬픔을 느끼지 아니하고, 상을 치르면서 서러워하지도 않았다. 이 세 가지가 없었는데도 喪禮를 치렀다는 명성이 魯나라를 덮었다. (莊子 6篇 大宗師)
▲可以參三才: 아! 사람이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어서 三才에 참여되어 만 가지 조화를 낼 수 있는 것은 본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才는 才質과 才能을 겸하여 말한 것으로, 곧 天·地·人을 가리킨다. (人之得名爲人 可以參三才 而出萬化者 以能不失其本心已. 心經附註序)
▲當合三先生: 敬을 잡아 지키는 방도는 마땅히 세 선생의 말씀을 합하여 공부해야 할 것이다. 三先生은 程子(伊川), 謝上蔡, 尹和靖 (持敬之道 當合三先生之言 而用力焉 然後內外交相養之功 始備. 敬以直內章 心經附註)
▲曾子三省: 나는 날마다 세 가지로 내 몸을 살피니 ’남을 위하여 일을 도모하면서 충성스럽지 않는가, 붕우와 사귀면서 信實하지 않는가, 스승에게 전수받은 것을 익히지 않았는가?‘ (吾日三省吾身 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 懲忿窒慾章 心經附註 )
▲三十而浸盛: 나는 타고난 기운이 매우 부족하여 30세가 되면서 점점 성해졌고, (四,五十세가 되어서야 완전해 졌다.(伊川先生曰 謂張思叔曰 三十而浸盛 四十五十以後完. 懲忿窒慾章 心經附註)
▲名三畏齋: 天命을 두려워하고 大人을 두려워하고 聖人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朱子曰 和靖尹公 一室 名三畏齋 取畏天命 畏大人 畏聖人之言之意. 禮樂不可斯須去身章 心經附註)
▲必三歎焉: 언제나 南軒張公의 ’위한 바가 없이 한다‘는 말씀을 욀 때에는 반드시 세 번 감탄하셨다.(每頌南軒張公 無所爲而然之語 必三歎焉. 尊德性齋銘 心經附註)
▲故有三才之別: 陰陽이 象을 이룸은 天道가 확립되는 것이요, 剛柔가 형질을 이룸은 地道가 확립되는 것이요, 仁義가 德을 이룸은 人道가 확립되는 것이니, 道가 하나(태극)일 뿐이나 일에 따라 나타나므로 三才가 구별이 있는 것이다. (陰陽成象 天道之所以立也 剛柔性質 地道之所以立也 仁義性德 人道之所以立也 道一而已 隋事著見 故有三才之別. 道體 近思錄集解)
▲積三十日而成一月: 한 기운이 갑자기 사라짐이 없고 또한 갑자기 자라남이 없으니, 卦를 달에 배합하면 30일을 쌓아 한 달을 이루고 또한 30분을 쌓아 한 爻를 이룬다. 9월은 괘에 있어서 박괘(剝卦)기 되니 陽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아니하여 아직 上九가 힌 효가 되어 卦로부터 剝卦에 이르기까지 30일이 되어야 陽이 비로소 다 사라지고 박괘(剝卦)로부터 坤卦에 이르기까지 30일이 되어야 비로소 坤卦에 이른다. (一氣武頓消 亦無頓息 以卦配月 積三十日而成一月 亦積三十分而成一爻. 道體 近思錄集解)
▲如三過其門不入: 세 번이나 자기 집 문 앞을 지나가면서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 禹·稷의 때에 있어서는 中이 되지만 만약 누추한 골목에서 거한다면 中이 아니며, 누추한 골목에 거하는 것이 顔子의 때에 있어서는 中이 되지만 만약 세 번이나 자기 집 앞을 지나가면서도 들어가지 않는다면 中이 아니다. (如三過其門不入 在禹稷之世 爲中 若居陋巷則非中也 居陋巷 在顔子之時 爲中 若三過其門不入則非中也. 道體 近思錄集解)
▲禮儀三百, 威儀三千: 예의 삼백 가지와 위의 삼천 가지가 한 가지 물건도 仁이 아닌 것이 없다. (禮儀三百 威儀三千 無一物而非仁也. 道體 近思錄集解),
▲三月不違仁: 伊尹과 顏淵은 大賢이니 그 군주가 堯·舜과 같은 성군이 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한 사람(家長)살 곳을 얻지 못하면 시장에서 종아리 맞는 것처럼 부끄럽게 여겼으며, 안연은 노여움을 남에게 옮기지 않고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았으며 3개월 동안 인을 떠나지 않았다.(伊尹顏淵 大賢也 伊尹 恥其君不爲堯舜 一夫不得其所 若達于市 顏淵 不遷怒 不貳過 三月不違仁. 爲學 近思錄集解)
▲其徒三千: 혹자가 성인(孔子)의 문하에 문도가 3천 명이었는데, 유독 顔子만을 배우기 좋아한다고 칭찬하셨다. 詩書六藝를 3천 명의 제자가 익혀서 통달하지 않음이 없었었다.(或問 聖人之門 其徒三千 獨稱顏子爲好學 夫詩書六禮 三千子非不習而通也. 爲學 近思錄集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