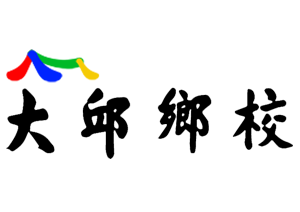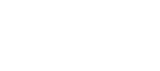세시(歲時)와 名日에 하는 행사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섣달 그믐밤(除夜)의 전날에는 어린아이들 수십 인을 모아다가 진자(辰子: 역위를 쫓아내는 동자)를 삼고 붉은 옷에 붉은 건을 쓴 차림을 하여 궁중에 바친다. 관상감에서 북과 피리를 준비하였다가 방상씨(方相氏: 옛날 역위를 분장한 사람)가 새벽이 되어서 그들을 몰아 쫓아낸다.
민간에서도 또한 이 일을 모방한다. 비록 辰子는 없으나 푸른 댓잎, 붉은 가시나무의 가지, 익모초의 줄기,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나무의 가지로써 합하여 비를 만들어 창살을 요란하게 뚜드리고 북과 꽹과리를 울리며 악귀를 문밖으로 쫓아낸다. 이것을 방매귀(放枚鬼)라고 한다.
이른 새벽에 그림 그린 종이를 문과 창과 사립문에 붙인다. 그 그림은 처용(處容), 각귀(角鬼), 종규(鍾馗: 악 귀를 잡아먹는다고 하는 귀신의 이름) 등 귀신의 얼굴이나 복두(幞頭)를 쓴 관인(官人)이나 투구에 갑옷 차림의 장군이나 진귀한 보물을 받들고 있는 부인의 상 또는 닭, 호랑이 등의 그림 따위이다.
그믐날 찾아뵙는 것을 과세(過歲)라 하고, 정월원단에 뵙는 것을 세배(歲拜)라고 한다. 원단(元旦)에 사람들은 다 일하지 아니하고 다투어 모여서 노름판을 벌이고 술을 마시면서 놀며 즐긴다.
새해의 첫날은 子日, 午日, 辰日, 亥日에도 이와 같이 놀았다. 또 아이들은 쑥을 모아 놓고 동산에 불을 지른다. 그리하여 亥日(돼짓 날)에는 돼지의 주둥이를 그을린다고 하고 子日(쥣날)에는 그을린다고 한다.
모든 관청이 3일 동안 출근하지 않는다. 다투어 친척과 벗과 동료의 집에 가서 명함을 던져 넣는다. 그래서 대가에서는 함을 설치하여 놓고 명함을 받았다. 근년 이래로 이 풍습이 갑자기 없어졌다. 또한,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월 15일은 元 夕이라고 한다. 이날 아침에는 약밥을 마련한다. 2월 초 하루는 화조(花朝)라 한다. 새벽에 문정(門庭) 솔잎을 흩어 놓는다. 세속에서 말하기를 그것은 빈대를 미워하여 솔잎으로 찔러서 물리친다는 뜻이라고 한다.
3월 3일은 상사(上巳)이다. 세속에서는 삼짇날(踏靑節: 푸른 풀을 밟을 때)이라 하여 사람들은 다 들에 나가 논다. 꽃이 있으면 화전(花煎)하여 술자리를 벌이고 새 쑥을 캐서는 쑥떡을 만들어 먹는다.
4월 8일에는 등을 단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이날이 석가여래(釋迦如來)가 탄생한 날이라고 한다. 봄철에 아이들이 종이를 끊어서 기(旗)를 만들고 물고기의 껍질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서 다투어 모여 떼를 지어서 마을과 거리를 돌면서 연등(燃燈) 감을 달라고 조른다. 이것을 이름하여 호기(呼旗)라고 한다.
이날이 되면 집집마다 장대를 세우고 등을 만들어 단다. 호부한 집들은 크게 채색 등잔의 층층 사다리를 만들어 단다. 층층으로 달린 수많은 등잔은 밤새도록 놀며 구경한다.
말썽꾸러기 소년들은 혹은 등을 쳐다보고 쏘아서 맞히는 것을 즐겨한다. 지금은 불교를 숭상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더러 등을 다는 이가 있긴 하지만 예전처럼 성대하지는 않다.
5월 5일은 단오(端午) 이다. 이날은 쑥으로 호랑이를 만들어 문에 달고 술에 창포를 띄우고 마신다. 아이들은 쑥으로 머리털을 땋고 창포로 띠를 하여 또 창포의 뿌리를 캐어 수염을 붙인다. 도성의 사람들은 거리에다 시렁을 만들고 그네를 맨다. 계집아이들이 아름다운 옷으로 곱게 단장하고 동리마다 요란스럽게 떠들며 다투어 그넷줄을 잡으니, 소년들은 떼를 지어 와서 그네를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음란한 농담 등 못하는 소리가 없다. 그래서 조정에서 금지하고 단속하니 지금은 성행하지 않는다.
6월 15일은 유두(流頭)라고 한다. 옛날 고려 때에 환관(宦官)의 무리가 동쪽 냇물에서 더위를 피하여 물에서 머리를 풀어서 떴다 잠겼다 하면서 술을 마시었다. 그리하여 유두라고 하면서 세사의 풍속이 그냥 이날을 명절로 하였다. 그날은 수단병(水團餠)을 만들어 먹는데 아마 괴엽냉도(槐葉冷淘)가 남긴 뜻일 것이다.
7월 15일은 세상에서 백중날(百種)이라 부른다. 불가에서는 백 종의 꽃과 과일을 우란분(盂蘭盆)을 마련한다. 여울 안의 여승(女僧)들이 사는 절에서는 더욱 심하다. 부여들이 모여들어 쌀을 바치고 망친(亡親)의 영을 불러 제사한다. 이따금 중이 가로(街路)에 상탁(床卓)을 차려 놓고 하는 일이 있었다. 지금은 엄중하게 풍속이 줄어들었다. 中秋에는 달구경을 하고 9월 9일에는 높은 곳에 오르며 冬至에는 팥죽을 먹고 경신일(庚申日)에는 잠자지 않는다. 다 옛날의 유속(遺俗)이다.
* 성현(成俔, 1439~1504)의 세시기(歲時記)는 世祖 8년에 발간되었었고, 조선 후기 正祖 年間에 홍석모(洪錫謨, 1781~1857)는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가 간행되었다. 성현의 위 본문기록은 용재총화(慵齋叢話)의 한 부분에 실려 있는 내용이라서 홍석모가 참고를 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용재총화의 위의 기사는 내려오는 풍습을 수필식으로 서술한 것이고, 홍석모의 東國歲時記는 正月부터 섣달까지 우리나라 1년 12달의 행사와 그 풍속은 22개 항목으로 나누어 상세히 기록했다. 맨 끝에는 윤월(潤月)에 행하는 풍속까지 기록되어 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1481년 성종 12)은 성종(成宗)의 명에 따라 노사신(盧思愼), 양성지(梁誠之), 강희맹(姜希孟) 등이 편찬한 지리지(地里誌)로 1530년 中宗 25년 완성되었다. 성현의 용재총화에서 인용.
섣달 그믐밤(除夜)의 전날에는 어린아이들 수십 인을 모아다가 진자(辰子: 역위를 쫓아내는 동자)를 삼고 붉은 옷에 붉은 건을 쓴 차림을 하여 궁중에 바친다. 관상감에서 북과 피리를 준비하였다가 방상씨(方相氏: 옛날 역위를 분장한 사람)가 새벽이 되어서 그들을 몰아 쫓아낸다.
민간에서도 또한 이 일을 모방한다. 비록 辰子는 없으나 푸른 댓잎, 붉은 가시나무의 가지, 익모초의 줄기,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나무의 가지로써 합하여 비를 만들어 창살을 요란하게 뚜드리고 북과 꽹과리를 울리며 악귀를 문밖으로 쫓아낸다. 이것을 방매귀(放枚鬼)라고 한다.
이른 새벽에 그림 그린 종이를 문과 창과 사립문에 붙인다. 그 그림은 처용(處容), 각귀(角鬼), 종규(鍾馗: 악 귀를 잡아먹는다고 하는 귀신의 이름) 등 귀신의 얼굴이나 복두(幞頭)를 쓴 관인(官人)이나 투구에 갑옷 차림의 장군이나 진귀한 보물을 받들고 있는 부인의 상 또는 닭, 호랑이 등의 그림 따위이다.
그믐날 찾아뵙는 것을 과세(過歲)라 하고, 정월원단에 뵙는 것을 세배(歲拜)라고 한다. 원단(元旦)에 사람들은 다 일하지 아니하고 다투어 모여서 노름판을 벌이고 술을 마시면서 놀며 즐긴다.
새해의 첫날은 子日, 午日, 辰日, 亥日에도 이와 같이 놀았다. 또 아이들은 쑥을 모아 놓고 동산에 불을 지른다. 그리하여 亥日(돼짓 날)에는 돼지의 주둥이를 그을린다고 하고 子日(쥣날)에는 그을린다고 한다.
모든 관청이 3일 동안 출근하지 않는다. 다투어 친척과 벗과 동료의 집에 가서 명함을 던져 넣는다. 그래서 대가에서는 함을 설치하여 놓고 명함을 받았다. 근년 이래로 이 풍습이 갑자기 없어졌다. 또한,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월 15일은 元 夕이라고 한다. 이날 아침에는 약밥을 마련한다. 2월 초 하루는 화조(花朝)라 한다. 새벽에 문정(門庭) 솔잎을 흩어 놓는다. 세속에서 말하기를 그것은 빈대를 미워하여 솔잎으로 찔러서 물리친다는 뜻이라고 한다.
3월 3일은 상사(上巳)이다. 세속에서는 삼짇날(踏靑節: 푸른 풀을 밟을 때)이라 하여 사람들은 다 들에 나가 논다. 꽃이 있으면 화전(花煎)하여 술자리를 벌이고 새 쑥을 캐서는 쑥떡을 만들어 먹는다.
4월 8일에는 등을 단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이날이 석가여래(釋迦如來)가 탄생한 날이라고 한다. 봄철에 아이들이 종이를 끊어서 기(旗)를 만들고 물고기의 껍질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서 다투어 모여 떼를 지어서 마을과 거리를 돌면서 연등(燃燈) 감을 달라고 조른다. 이것을 이름하여 호기(呼旗)라고 한다.
이날이 되면 집집마다 장대를 세우고 등을 만들어 단다. 호부한 집들은 크게 채색 등잔의 층층 사다리를 만들어 단다. 층층으로 달린 수많은 등잔은 밤새도록 놀며 구경한다.
말썽꾸러기 소년들은 혹은 등을 쳐다보고 쏘아서 맞히는 것을 즐겨한다. 지금은 불교를 숭상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더러 등을 다는 이가 있긴 하지만 예전처럼 성대하지는 않다.
5월 5일은 단오(端午) 이다. 이날은 쑥으로 호랑이를 만들어 문에 달고 술에 창포를 띄우고 마신다. 아이들은 쑥으로 머리털을 땋고 창포로 띠를 하여 또 창포의 뿌리를 캐어 수염을 붙인다. 도성의 사람들은 거리에다 시렁을 만들고 그네를 맨다. 계집아이들이 아름다운 옷으로 곱게 단장하고 동리마다 요란스럽게 떠들며 다투어 그넷줄을 잡으니, 소년들은 떼를 지어 와서 그네를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음란한 농담 등 못하는 소리가 없다. 그래서 조정에서 금지하고 단속하니 지금은 성행하지 않는다.
6월 15일은 유두(流頭)라고 한다. 옛날 고려 때에 환관(宦官)의 무리가 동쪽 냇물에서 더위를 피하여 물에서 머리를 풀어서 떴다 잠겼다 하면서 술을 마시었다. 그리하여 유두라고 하면서 세사의 풍속이 그냥 이날을 명절로 하였다. 그날은 수단병(水團餠)을 만들어 먹는데 아마 괴엽냉도(槐葉冷淘)가 남긴 뜻일 것이다.
7월 15일은 세상에서 백중날(百種)이라 부른다. 불가에서는 백 종의 꽃과 과일을 우란분(盂蘭盆)을 마련한다. 여울 안의 여승(女僧)들이 사는 절에서는 더욱 심하다. 부여들이 모여들어 쌀을 바치고 망친(亡親)의 영을 불러 제사한다. 이따금 중이 가로(街路)에 상탁(床卓)을 차려 놓고 하는 일이 있었다. 지금은 엄중하게 풍속이 줄어들었다. 中秋에는 달구경을 하고 9월 9일에는 높은 곳에 오르며 冬至에는 팥죽을 먹고 경신일(庚申日)에는 잠자지 않는다. 다 옛날의 유속(遺俗)이다.
* 성현(成俔, 1439~1504)의 세시기(歲時記)는 世祖 8년에 발간되었었고, 조선 후기 正祖 年間에 홍석모(洪錫謨, 1781~1857)는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가 간행되었다. 성현의 위 본문기록은 용재총화(慵齋叢話)의 한 부분에 실려 있는 내용이라서 홍석모가 참고를 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용재총화의 위의 기사는 내려오는 풍습을 수필식으로 서술한 것이고, 홍석모의 東國歲時記는 正月부터 섣달까지 우리나라 1년 12달의 행사와 그 풍속은 22개 항목으로 나누어 상세히 기록했다. 맨 끝에는 윤월(潤月)에 행하는 풍속까지 기록되어 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1481년 성종 12)은 성종(成宗)의 명에 따라 노사신(盧思愼), 양성지(梁誠之), 강희맹(姜希孟) 등이 편찬한 지리지(地里誌)로 1530년 中宗 25년 완성되었다. 성현의 용재총화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