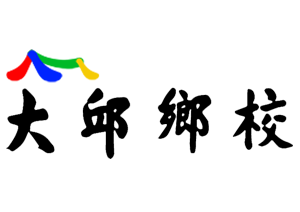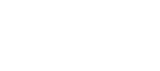성균관은 교훈(敎訓)을 전당(傳掌)하는 곳이다. 국가에서 양현고(養賢庫: 성균관은 유생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관아) 설치하고 관원으로서 겸직하게 하였으며, 항상 유생 2백 명을 기른다.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의 계주(啓奏)로 존경각(尊經閣)을 세우고 경서(經書)의 서적들을 많이 간인(刊印)하여 간직하였으며, 공천군(廣川君) 이극증(李克增)의 계주(啓奏)로 전사청(典祀廳)을 건축하고 또한 나의(成俔) 계주로 당관청(當官廳)을 세웠다. 그 뒤에 성전(聖殿)과 동서무(東西廡)와 식당을 개축하고 또 베 오백여 필과 쌀 삼백여 섬을 하사하였으며, 관중(館中)의 수용비에 대비하게 하였다.
이극증(李克增)이 아뢰기를 이제 성은을 입어 많은 쌀과 베의 하사를 받았습니다. 비옵건대 ‘술과 음식을 준비하여 조정의 문사와 여러 유생을 모아 사문(斯文)의 성사(盛事)로 삼게 하십시오’ 하니, 성묘(成廟)가 윤허(允許)하였다. 이에 明倫堂에서 대회를 여니 음식이 매우 정결(精潔)하였다. 승지(承旨)가 선은(宣醖: 임금이 베푼 술)과 어주(御廚:수라간)의 진미를 가져오는 것이 잇달아서 끊이지 않았다.
계축년(癸丑年) 가을에는 성균관에 거동하여 지성성사(至聖先師) 즉 孔子를 제사하고 물러 나와 하연대(下輦臺)의 장전(帳殿:임금이 앉도록 한 자리)에 납시니 문신(文臣) 재상들은 전내(殿內)에 들어가 모시고, 당하관인 문신들은 전내에 들어가 모시고, 당하관인 문신들은 뜰에 나누어 멀리 앉았다. 八道의 유생들이 서울에 구름처럼 모인 자가 무려 만여 명이었다.
上下가 모두 꽃을 꽂고 잔치에 참여하였으며 새로 지은 악장(樂章)을 연주하면서 모시고 먹었다. 관사(官司)가 나누어 맡아서 음식을 마련하였으며, 임금이 자주 내신(內臣)을 보내어 독찰(督察)하였다. 사람들이 다 취하고 배부르게 먹었다. 이런 성사응 예전에도 없었던 일이었다.
※사문의 성사(斯文 盛事):사문은 유교라는 뜻이고, 성사는 성대한 일이니 유교의 성대한 행사한다는 뜻이다.
※본문은 용재총화(慵齋叢話)에서 인용. 한국명저 대전집. 남만성(南晩星 譯) 대양출판사(1973.4.20. 간)
※ 성현(成俔):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에서 인용.
성현(成俔, 1439년∼1504년)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관료 문인이다. 본관은 창녕(昌寧)으로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염조(念祖)의 셋째 아들이다. 자는 경숙(磬叔), 호는 용재(慵齋)·허백당(虛白堂)·부휴자(浮休子)·국오(菊塢), 시호는 문대(文戴)다.
1462년(세조 8년) 식년문과(式年文科)에, 1466년 발영시(拔英試)에 급제해 박사(博士)로 등용되었다. 이어 사록(司錄) 등을 거쳐 1468년 예문관수찬(藝文館修撰)을 지냈다. 맏형 임(任)을 따라 명나라 사행(使行) 때 지은 기행시를 정리해 ≪관광록(觀光錄)≫으로 엮었다. 1475년 다시 한명회(韓明澮)를 따라 명나라에 다녀와서 이듬해 문과중시(文科重試)에 급제, 대사간 등을 지냈다. 1485년 천추사(千秋使)로 명나라에 다녀와 형조참판 등을 거쳐, 평안도관찰사를 지냈다.
평안도관찰사로 있을 때 명나라 사신 동월(董越)과 왕창(王敞)이 왔는데 이들과 시를 주고받아 그들을 탄복하게 했다. 이어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가 되어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다녀와 경상도관찰사로 나갔다가 예조판서에 올랐다. 연산군이 즉위하자 공조판서로 대제학(大提學)을 겸임했다. 죽은 지 수개월 후 갑자사화(甲子士禍)가 일어나 부관참시(剖棺斬屍)당했다. 뒤에 신원(伸寃)되고, 청백리(淸白吏)에 녹선(錄選)되었다.
글씨를 잘 썼으며, 특히 음률(音律)에도 밝아 장악원제조(掌樂院提調)를 겸하고 유자광(柳子光) 등과 함께 ≪악학궤범≫을 편찬해 음악을 집대성했다. 뿐만 아니라 왕명으로 고려가요 <쌍화점(雙花店)>, <이상곡(履霜曲)>, <북전(北殿)>을 개산(改刪)했다. 대표 저술인 ≪용재총화≫는 조선 초기의 정치·사회·문화·제도·풍속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밖에 ≪허백당집≫, ≪풍아록≫, ≪부휴자 담론≫, ≪주의패설(奏議稗說)≫, ≪금낭행적(錦囊行跡)≫, ≪상유비람(桑楡備覽)≫, ≪풍소궤범≫, ≪경륜대궤(經綸大軌)≫, ≪태평통재(太平通載)≫ 등 많은 저술이 있다.
이극증(李克增)이 아뢰기를 이제 성은을 입어 많은 쌀과 베의 하사를 받았습니다. 비옵건대 ‘술과 음식을 준비하여 조정의 문사와 여러 유생을 모아 사문(斯文)의 성사(盛事)로 삼게 하십시오’ 하니, 성묘(成廟)가 윤허(允許)하였다. 이에 明倫堂에서 대회를 여니 음식이 매우 정결(精潔)하였다. 승지(承旨)가 선은(宣醖: 임금이 베푼 술)과 어주(御廚:수라간)의 진미를 가져오는 것이 잇달아서 끊이지 않았다.
계축년(癸丑年) 가을에는 성균관에 거동하여 지성성사(至聖先師) 즉 孔子를 제사하고 물러 나와 하연대(下輦臺)의 장전(帳殿:임금이 앉도록 한 자리)에 납시니 문신(文臣) 재상들은 전내(殿內)에 들어가 모시고, 당하관인 문신들은 전내에 들어가 모시고, 당하관인 문신들은 뜰에 나누어 멀리 앉았다. 八道의 유생들이 서울에 구름처럼 모인 자가 무려 만여 명이었다.
上下가 모두 꽃을 꽂고 잔치에 참여하였으며 새로 지은 악장(樂章)을 연주하면서 모시고 먹었다. 관사(官司)가 나누어 맡아서 음식을 마련하였으며, 임금이 자주 내신(內臣)을 보내어 독찰(督察)하였다. 사람들이 다 취하고 배부르게 먹었다. 이런 성사응 예전에도 없었던 일이었다.
※사문의 성사(斯文 盛事):사문은 유교라는 뜻이고, 성사는 성대한 일이니 유교의 성대한 행사한다는 뜻이다.
※본문은 용재총화(慵齋叢話)에서 인용. 한국명저 대전집. 남만성(南晩星 譯) 대양출판사(1973.4.20. 간)
※ 성현(成俔):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에서 인용.
성현(成俔, 1439년∼1504년)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관료 문인이다. 본관은 창녕(昌寧)으로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염조(念祖)의 셋째 아들이다. 자는 경숙(磬叔), 호는 용재(慵齋)·허백당(虛白堂)·부휴자(浮休子)·국오(菊塢), 시호는 문대(文戴)다.
1462년(세조 8년) 식년문과(式年文科)에, 1466년 발영시(拔英試)에 급제해 박사(博士)로 등용되었다. 이어 사록(司錄) 등을 거쳐 1468년 예문관수찬(藝文館修撰)을 지냈다. 맏형 임(任)을 따라 명나라 사행(使行) 때 지은 기행시를 정리해 ≪관광록(觀光錄)≫으로 엮었다. 1475년 다시 한명회(韓明澮)를 따라 명나라에 다녀와서 이듬해 문과중시(文科重試)에 급제, 대사간 등을 지냈다. 1485년 천추사(千秋使)로 명나라에 다녀와 형조참판 등을 거쳐, 평안도관찰사를 지냈다.
평안도관찰사로 있을 때 명나라 사신 동월(董越)과 왕창(王敞)이 왔는데 이들과 시를 주고받아 그들을 탄복하게 했다. 이어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가 되어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다녀와 경상도관찰사로 나갔다가 예조판서에 올랐다. 연산군이 즉위하자 공조판서로 대제학(大提學)을 겸임했다. 죽은 지 수개월 후 갑자사화(甲子士禍)가 일어나 부관참시(剖棺斬屍)당했다. 뒤에 신원(伸寃)되고, 청백리(淸白吏)에 녹선(錄選)되었다.
글씨를 잘 썼으며, 특히 음률(音律)에도 밝아 장악원제조(掌樂院提調)를 겸하고 유자광(柳子光) 등과 함께 ≪악학궤범≫을 편찬해 음악을 집대성했다. 뿐만 아니라 왕명으로 고려가요 <쌍화점(雙花店)>, <이상곡(履霜曲)>, <북전(北殿)>을 개산(改刪)했다. 대표 저술인 ≪용재총화≫는 조선 초기의 정치·사회·문화·제도·풍속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 밖에 ≪허백당집≫, ≪풍아록≫, ≪부휴자 담론≫, ≪주의패설(奏議稗說)≫, ≪금낭행적(錦囊行跡)≫, ≪상유비람(桑楡備覽)≫, ≪풍소궤범≫, ≪경륜대궤(經綸大軌)≫, ≪태평통재(太平通載)≫ 등 많은 저술이 있다.